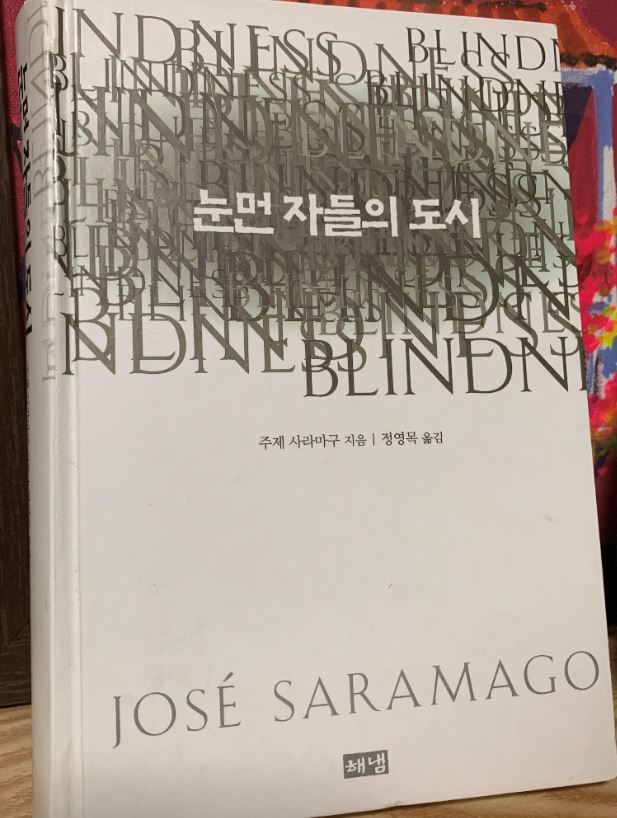[ 읽게 된 동기 ]
STEW 독서소모임 첫 소설 책.
[ 한줄평 ]
서평을 쓰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서평 ]
아마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 가장 가벼운 책이 아니었나 싶다.
이불 위에서 슥슥 한 권을 뚝딱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두께와 이런 내용을 읽었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다… 왜냐면 내가 최근 읽은 책들이라 함은….
[서평] 일의 미래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
… 그만 알아보자.
무튼 무게감이 있는 책을 읽다가 정말 3시간 정도 반쯤 누워서 슥슥 읽었다. 읽다보니 ‘햄릿’이라는 작품의 줄거리가 조금씩 떠올랐다. 어차피 햄릿 내용은 대다수의 사람이 알테니 조금 스포일러를 해보면…
왕자 햄릿은 죽은 왕인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 아버지가 살해됐음을 듣고, 복수를 꿈꾼다. 광대를 이용해 삼촌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잉글랜드로 팔려갈뻔 했지만 다시 돌아와 복수를 시작한다. 아쉽지만 삼촌도, 햄릿도, 어머니도 그리고 햄릿이 사랑했던 여인과 그녀의 가족 모두도 죽었다는 비극적인 결말.
사실 이 소설을 또 읽고도 ‘내가 이걸 왜 읽는건가…’ 하는 고민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나는 이런 고전과 친하지 않은게 분명하다. 게다가 번역상 문제인지 끊임없이 말장난을 해대는 것을 다 읽고 있자니 짜증이 치밀었다.
간단하게 말합시다… 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기라고 해서 기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기가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소린가…
어쨌든 햄릿은 비극의 주인공이 됐지만, 명언을 남겼고. 나는 소설 속 햄릿의 고뇌와 비슷한 현실 속 내 모습을 비교해보는 나름의 서평을 적어볼까 한다.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뭘 해야 하는가?
햄릿은 많은 고뇌의 갈림 길에 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 길. 나는 그 중 햄릿이 가장 답답했을 시기를 소설의 초반부로 꼽고 싶다. 아버지 영혼을 만나기 전 말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뒤, 삶의 의욕을 잃었을 그 시절. 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도대체 난 뭘 해야 하는지를 걱정하던 그 때 말이다.
아마도 현재의 청년들이 겪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나 역시 취업 전 대학시절 겪었던 시기고,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당연히 돌아가겠지만 초기화 돼 그때의 막막함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
누군가는 ‘뭣도 아니기에 뭐든 될 수 있다며’ 말장난 할 수도 있겠지만, 뭐든 될 수 있기만 한가? 뭣도 안된 채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을. 이런 류의 말장난을 하는 사람에겐 말장난으로 되돌려주고 싶다.
그래, 로또 확률도 50%야. 되거나 안 되거나.
셰익스피어의 햄릿 원본도 이런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오히려 초반부 햄릿이 아버지 영혼을 만나기 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2달을 버텼을지 말이다. 그 괴로웠을 2달 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어머니의 재혼을 바라보며 왜 견뎌냈는지 말이다.
내가 햄릿이라면 복수를 할지, 말지 보다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계획을 하느냐? 마느냐?
올해 직업을 바꾸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개발자와 기자는 정말 많은 점이 다르지만, 최근 느끼는 정말 다른 점 중 하나는 ‘노력이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몇 달 간을 공들였지만 너무도 쉽게 엎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별 생각 없이 하던대로 진행했는데 노력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그런거야’라며 사람 편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가?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쓴 기사가 바이럴 마케팅이 잘 돼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이 마냥 기쁠 것 같았는데, 몇 번 경험하다보니 당췌 바이럴이 되는 포인트를 못찾겠더라. 이게 참 괴롭다.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그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자’ 하고 쓴 글이 터져버리면 사실 좀 싫기도 하다.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 꿈이라는 게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은 결국 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돼 간다. 아직도 단단해지려면 한참 멀었고, 내가 보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지만 욕심이란게 그리 간단히 정리 되지는 않더라. 더 잘하고 싶고, 더 빨리, 더 큰 성과를 내고 싶고, 남의 떡이 더 커보이고 말이다.
다시 앞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그래서 공들이지 않은 일이 좋은 성과를 낼 때는 사실 좋은 성과 만큼 걱정이 되기도 한다. 여전히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좋은 결과는 달갑지만은 않다.
깊게는 차라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몸 가는 대로 일을 할까 싶기도 한다.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햄릿이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차라리 햄릿 혼자 죽었더라면, 삼촌이라도 어머니와 행복했겠지. 아버지의 죽음을 모른채 하고 오필리아와 살았다면, 그것도 또 나름의 행복이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모두 죽은 이 상황을 과연 죽은 아버지는 만족해 했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투였을까?
그런 점에서 나는 햄릿의 행보를 박수치고 싶진 않다. 결국 누구도 승자가 없는 전투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은 이해한다만, 결과 마저 그리 됐으니 그 점이 참 아쉽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햄릿’은 어디 있었냐는 말이다.
햄릿, 스스로가 하고자 했던 일은 뭐였나? 왕이 되고 싶었던거라면, 삼촌을 죽일 기회가 왔을 처음에 죽였어야 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좀 더 괴롭게 죽이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결국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좀 전의 그 배우에 비하면 난 정말 헛 살고 있지 않아? 그자는 단지 허구일 뿐인 상상의 사건에도 격정을 토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배역에 영혼을 쏟아부어 얼굴이 온통 해쓱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야말로 온몸의 기능 하나하나가 제 배역의 연기를 위해 열렬히 반응하고 있어.
언젠가 새벽에 일어나 축구를 본 적이 있다. 스페인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경기였는데, 당시 레알마드리드의 우측 풀백 ‘다니엘 카르바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미친듯이 질주하는 그 모습에서 인용문 속 햄릿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저 선수는 왜 저렇게 미친듯이 뛰나? 나는 왜 저렇게 안뛰나? 저 선수가 뛰는 곳은 세계 최고의 클럽, 세계 최고의 리그, 세계 최고의 경기. 나는 왜 세계 최고에 속하지 못하나? 나는 속하면 안되나? 나는 왜 세계 최고에 속하려는 생각 조차 하지 않았나?
그쯤 비슷한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리곤 ‘세계 최고는 무엇인가?’ 따위의 철학적 질문들을 했던 것 같다. 꼭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지, 위로 달려야만 하는지, 앞으로 달려야만 하는지 등 말이다.
결국 답은 ‘나’ 였다. 내가 달리는게 좋으면 달리고, 위로 향하는게 좋으면 위로 향하는 것이다. 내가 숨쉬는 역사가 곧 내가 된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햄릿은 햄릿으로 살았을까? 글쎄, 햄릿이 있기는 했을까?
나는 나로서 살고 있을까? 글쎄, 나는 누구인가?
[ 인상 깊은 문구 ]
- 그 꿈이라는 게 바로 야망입니다. 야망은 결국 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 좀 전의 그 배우에 비하면 난 정말 헛 살고 있지 않아? 그자는 단지 허구일 뿐인 상상의 사건에도 격정을 토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배역에 영혼을 쏟아부어 얼굴이 온통 해쓱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야말로 온몸의 기능 하나하나가 제 배역의 연기를 위해 열렬히 반응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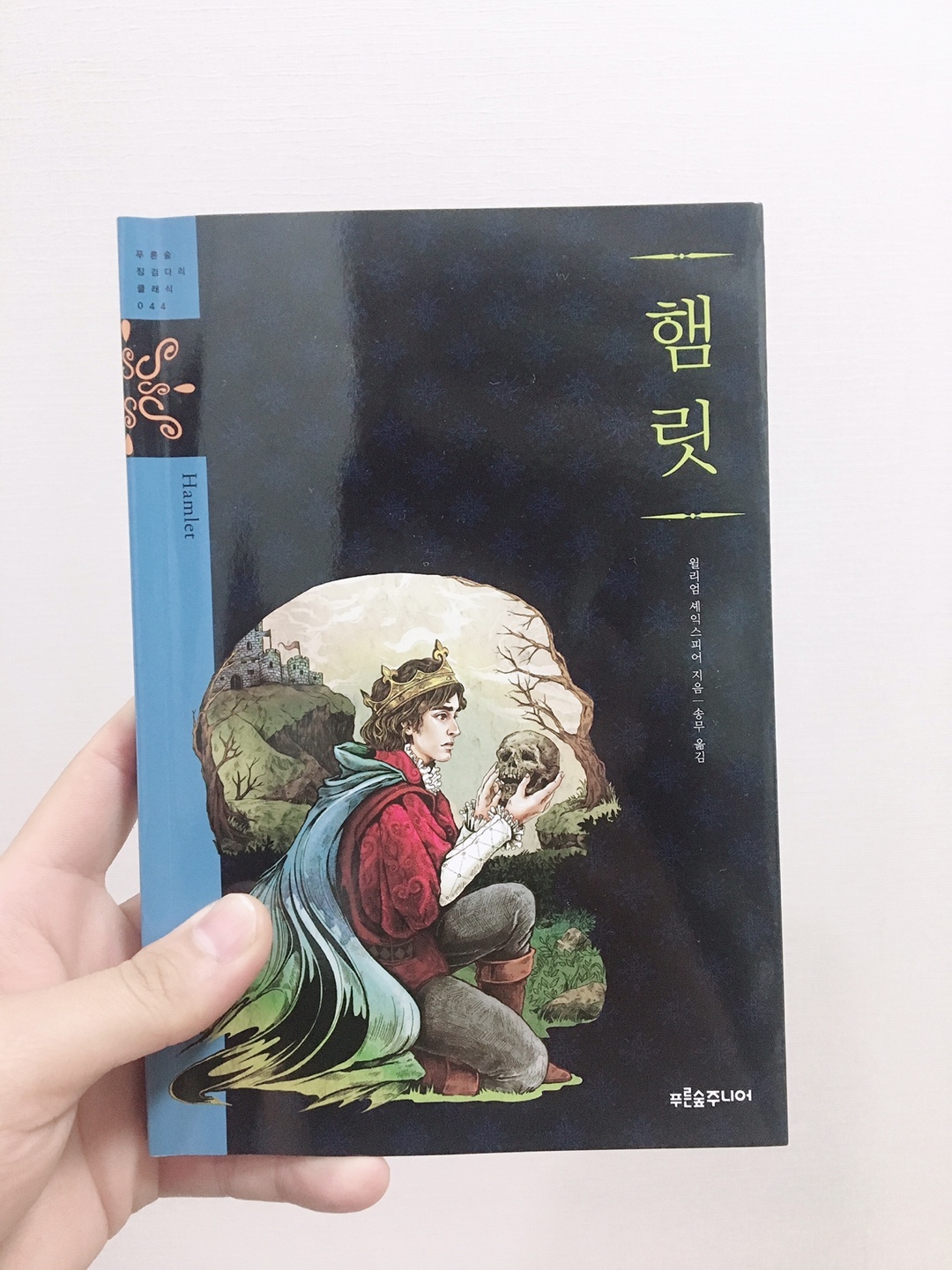


![[서평]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http://52.78.175.177/wp-content/uploads/2025/07/IMG_7430-360x180.jpg)